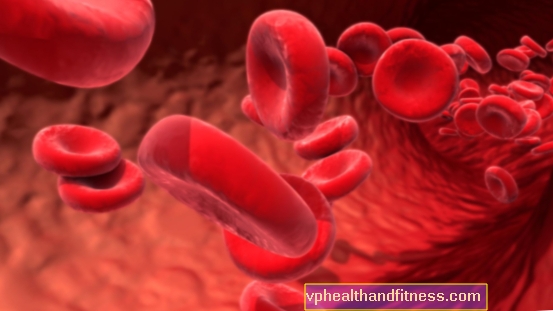다른 병동에 머무는 환자의 영양 실조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상당히 흔한 문제입니다.
병원에 입원 한 사람들의 약 35-55 %가 영양 실조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며, 이들 중 1/5은 영양 실조가 심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영양 치료가 필요합니다 1.
그러나 건강한 영양 상태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도 입원 중에 영양 실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데이터에서 알 수 있듯이 최대 30 %의 환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입원 당시 영양 실조에 걸린 환자의 70 %는 입원 기간 동안 상태가 악화됩니다.
병원 영양 실조의 원인은 무엇입니까?
1. 질병의 경과로 인한 영양 실조
이에 대한 몇 가지 이유가있을 수 있습니다. 종종 영양 실조는 질병 자체의 진행으로 인해 발생하며, 이로 인해 신진 대사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. 체중 감소는 암 환자의 최대 80 %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며, 체중 감소는 종종 질병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믿어집니다 2.
또한 신경계 질환을 앓고있는 영양 실조 환자의 비율을 추정하려는 시도가 많이있었습니다. 뇌졸중 환자의 8 ~ 62 %, 근 위축성 측삭 경화증 환자의 약 16 %, 심각한 두부 손상 후 70 %, 질병 환자의 24 %에서 영향을받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파킨슨 병 3.
2. 병원 식단
환자의 영양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는 입원식이입니다. 입원식이 좋지 않고 칼로리가 낮으며 가치가 거의 없으며 종종 식사 횟수를 조절하지 않고 투여합니다.
또한, 입원 환자는 수술 전후 및 진단 검사 중에 매우 자주 굶주 리며, 환자는 종종 빈속에 나타나도록 권장됩니다. 식사 사이의 간격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종종 마지막 식사는 오후 6시에 제공되고 첫 번째 식사는 오전 8시에 제공됩니다.
영양 상태가 치료에 미치는 영향
부적절한 영양 상태는 치료 과정에 영향을 주어 감염을 일으키고 때로는 수술, 화학 요법 또는 방사선 요법을받을 자격이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영양 실조는 염증을 동반하여 신체의 단백질과 에너지에 대한 요구를 추가로 증가시킵니다.
환자의 경우 부상이나 수술 후 신진 대사가 바뀌고 기본 신진 대사가 증가하므로 적절한 양의 에너지와 단백질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또한 광범위한 수술 후 상처 또는 만성 상처의 존재는 신체에 더 많은 영양분을 필요로합니다. 욕창과 같은 만성 상처가있는 환자의 경우 환자의 에너지 요구량은 35-40kcal / kg 체중으로 증가하고 단백질은 1.5 ~ 2.0g / kg 체중 / 일 4로 증가합니다.
영양분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?
병동에 머무는 환자는 식사 사이에 특별한 의료 목적을위한 음식을 포함하여 영양소 공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. Nutramil Complex® 또는 Nutramil Complex® Protein과 같은 특수 영양 보충제. 이들은 모든 영양소를 적절한 비율로 포함하는 특별한 제품이며, 맛있는 칵테일을 만들거나 식사에 추가하여 영양가를 높일 수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포함합니다.
영양 실조는 신체의 가장 큰 면역 기관인 장에 큰 영향을 미치며 면역 기능의 저하는 영양 실조 단계 초기에 시작됩니다.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영양 치료를 도입하는 것이 가치가 있으며 장 영양은 장과 관련된 면역 체계를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위장 활동을 자극합니다.
특별한 음식 준비를 선택할 때 제품의 구성과 내성에주의하십시오. 삼투압이 가장 낮은 제품을 선택하여 삼투 성 설사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.
모든 우려 사항은 자격을 갖춘 영양사 또는 영양사, 간호사, 1 차 진료 의사, 언어 치료사, 사회 복지사 및 / 또는 치과 의사 팀에게보고해야합니다.
출처 :
1. Ostrowska J., Jeznach-Steinhagen A., 병원 영양 실조. 영양 상태 평가 방법, 가정 의학 포럼, 2017; 11 (2) : 54-61
2. Szczepanik A.M., Walewska E., Ścisło L. 외. 위장관의 악성 종양이있는 환자의 영양 실조 평가. Probl Maint. 2010; 18 : 384–392.
3. Kłęk S., et.al., 신경학의 영양 치료-학제 간 전문가 그룹의 입장, Polski Przegląd Neurologiczny, 2017; 14 (3) : 106-119
4. Kłęk S., 상처 치유 과정에서 영양 치료의 역할, 상처 치료, 2013; 10 (4) : 95-99
파트너